
雙劒
增
刃長二尺五寸柄長五寸五分重八兩[案. 今不別造 擇腰刀之崔短者用之故不列圖焉].
칼날 길이는 2척 3촌이고, 자루 길이는 5촌 5분이며, 무게는 8냥이다[안. 지금은 별도로 제조하지 않고서 요도에서 가장 짧은 것을 골라 사용하므로 그림으로 늘어 놓지 않는다].
豫器圖式曰 綠營[直隷各城. 漢軍營曰 綠旗]雙手左右雙持 通長各二尺一寸一分, 刃長一尺六寸, 濶一寸. 銎[方彦曰稱之銎注 卽矛刃下口. 案. 在刀 則環也. 雙刀 各爲半規者欲 其幷容一鞘]爲半規 厚二分, 幷納於室 柄長四寸九分. 木質 纏紅 末鉆[音覘. 正字通曰 凡器兩頭交合用鐵片錮之 或轉角處 鐵片兩頭拘定之皆曰鉆.] 以鐵[案. 綠營雙刀最短之刀. 而雙刀一鞘可以取法].
예기도식에 이르기를 "녹영[각 성에 직접 예속해 있다. 한군영에 이르기를 녹기라고 한다라고 했다.]에서 좌우 두 손에 쌍으로 쥐며, 통상 길이가 각 2척 1촌 1분이고, 날의 길이는 1척 6촌이며, 폭은 1촌이다. 구멍[방언에 이르기를 구멍을 낸다라고 칭한다는데, 즉 창날 아래 입이다. 안. 칼에 있어서 곧 고리 모양이다. 쌍도에서는 각각 반원이라는 것을 추구하여 그를 합치면 하나의 칼집 모양이다.]을 반원으로 하는데, 두께는 2분이고, 아울러 칼집에 넣으면 자루 길이는 4촌 9분이다. 나무 재질이고, 붉게 감으며, 마지막에는 뚫는데(鉆)[음은 점(覘)이다. 정자통에 이르기를 "무릇 병기의 두 머리를 교차해서 합치는데 쇠조각을 사용하여 잡아 매거나 혹은 각진 곳을 부리려고 쇠조각으로 두 머리를 잡아 고정하는 것을 모두 뚫는다라고 말 한다], 쇠[안. 녹영 쌍도는 가장 짧은 칼이다. 쌍도를 하나의 칼집에 넣은 것은 가히 본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로써 한다"라고 하였다.
[주]
1. 녹영(綠營), 녹기(綠旗): 만주 8기군 수가 부족하자 한족 50만명을 선발해 편성한 청국 상비병으로서 녹색 기를 병영의 상징으로 삼아 각 성에서 군무와 치안을 담당하였다.
2. 공(銎), 모인하구(矛刃下口): 공은 도끼에 자루를 끼워 고정하려고 도끼에 낸 구멍에서 유래했다. 모인하구는 창 자루를 끼운 뒤 고정하는 못을 박을 수 있게 창날 아랫 부분에 뚫은 구멍이다. 칼에서는 칼날을 자루에 고정하려고 뚫은 구멍과 코등이에 뚫은 구멍이다.
3. 반규(半規): 반원이다. 두 칼날을 하나의 칼집에 넣으려면 각기 자루 머리에 끼우는 코등이를 반원으로 해야 합쳤을 때 일반 칼 자루처럼 둥글게 된다.
4. 正字通曰 凡器兩頭交合用鐵片錮之 或轉角處 鐵片兩頭拘定之皆曰鉆: 쌍검에서는 자루와 코등이 뿐만 아니라, 더 하여 자루 꼬리에 철판 덮개를 씌워서 고정하려고 자루 철판 덮개에도 구멍을 뚫어 쇠못을 박았다.
武編曰 宋太宗𨕖用士數百人 敎以劍舞皆能擲劍空中躍其身左右承. 之會北戎[契丹也] 遣使宴更殿因出劍士示之 袒裼 鼓譟 揮刃 而入跳 擲承 接霜刀雪刀 飛舞滿空, 戎使見之懼形于色. 每巡城耀武劍舞前導 賊衆椉城壁之破膽.
무편에 이르기를 "송 태조는 사내 수 백인을 가려서 썼는 바, 검무를 가르쳤더니 모두 능히 공중에 검을 던지고서 그 몸으로 뛰어 올라 좌우로 받았다. 모임에서 북융[거란이다.]에서 파견한 사신에게 전각에서 다시 연회를 베풀었고, 인하여 칼 쓰는 사내들이 나와 웃통을 벗고서 북을 치면서 들썩이다가 칼날을 휘두르며 들어가 뛰고, 던져서 받는 것을 서릿발 칼과 눈 칼을 접하듯 하여 허공 가득히 뛰어 오르는 춤을 보이니, 융 사신이 보고서 두려워 하는 얼굴색을 하였다. 언제나 성을 순시할 때 앞으로 인도하여 검무로 무예를 빛내니, 도적떼가 성벽을 오르려다 담력이 흩어졌다"라고 하였다.
元史王英轉 英[字邦傑 益都人 莒州千戶]善用雙刀號曰刀王.
원사 왕영전에 영[자는 방걸이고, 익도 사람으로서 거주에서 천호였다.]은 쌍도를 잘 써서 별호가 이에 도왕이었다고 한다.
兵略纂聞曰劉顯[南昌人 官都督綖父也.]不胄不介遇敵提兩刀 騰躍 超踴, 趫倢若飛刀 起見刃不見公.
병략찬문에 이르기를 "유현[남창 사람으로서 관직이 도독이었던 연의 아버지다.]은 투구를 쓰지 않고, 갑옷을 입지 않고서도 적과 마주치면 두 칼을 들고서 뛰어 오르고, 뛰어 넘으며, 빠르고 날래서 칼이 날아 다니는 것 같아 거듭 칼날은 보이는데, 공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案
刀劍之器衛身以設古者必有法術, 若後世之有譜訣. 是以魯勾踐[戰國 邯鄲人 與荆軻遊]嘆荆卿之疎於劍術也. 周秦以降無所攷証.
도검이라는 무기로 위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옛 것에도 반드시 방법과 기술이 있었으니, 후세에 검보와 비결이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이유로 노구천[전국시대 한단 사람으로서 형가와 더불어 벗이었다.]은 형경이 검술에 엉성하자 탄식하였다. 주나라와 진나라 이후 살펴서 밝힐 방도가 없다.
然家語曰 子路戎服 見於孔子 拔劍而舞曰古之君子以劍自衛. .
그러하나 가어에 이르기를 "자로가 융복을 입고서 공자를 뵈러 와서 칼을 뽑아 춤을 추면서 말하기를 "옛날의 군자는 검으로써 자신을 지켰습니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史記曰 項羽會沛公 項莊項伯拔劍起舞. 夫於劍爲舞 若持干戚[戚與鏚同斧鏚也. 禮記 朱干玉戚 冕而舞大武.]而舞焉. 則寓擊刺之術而豫武備也. 至若舞劍當用雙刀 以其非干與戚之樇[木長也.]且重也.
사기에 이르기를 "항우가 패공과 만났을 때 항장과 항백이 검을 뽑아 일어서 춤을 추었다"라고 하였다. 사내가 검으로 춤을 추는 것은 방패와 도끼(戚)[戚(척)은 鏚(척)과 더불어 斧鏚(부척)과 같다. 예기에 붉은 방패와 옥도끼를 들고서 면류관을 쓰고서 큰 무예의 춤을 춘다라고 하였다.]를 들고서 추는 것과 같다. 곧 치고 찌르는 기술에 의지하는 것은 무술을 갖추어 예비하는 것이다. 검으로 추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당연히 쌍도를 쓰는데, 그에 맞지 않게 방패와 도끼의 수나무(樇)[나무가 길다]는 또한 무거워서다.
[주]
朱干玉戚 冕而舞大武 : 주나라 2대왕 성왕이 자기 아버지 무왕을 도와 상나라 주왕을 치고서 그 공로로 노나라 공으로 책봉 받고,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도와 준 작은 아버지 주공을 기리는 제사를 지낼 때 행한 의식중 일부이다. 작은 아버지의 나라 노나라에게만 제후국임에도 천자만이 행할 수 있는 8승무를 제사에서 출 수 있게 허용하였다.
季夏六月 以禘礼祀周公于大廟. 牲用白牡. 尊用犧象,山罍. 鬱尊用黄目. 灌用玉瓚,大圭. 薦用玉豆,雕篹. 爵用玉盏. 仍雕, 加以璧散璧角. 俎用梡嶡. 升歌清廟 下管象. 朱干玉戚 冕而舞大武. 皮弁素積 裼而舞大夏. 昧東夷之樂也. 任南蠻之樂也. 納夷蠻之樂於大廟 言廣鲁于天下也.
늦여름 유월(양력 8월)에 제사의 예로써 태묘에서 주공에게 제사를 지낸다. 희생에 흰 숫소를 쓴다. 술 그릇으로 사상(코끼리 모양의 술잔)과 산뢰(산을 그린 술단지)를 쓴다. 울창주 술 그릇으로 황목(눈을 황금으로 도금한 술단지)을 쓴다. 따르는데 옥창대규(옥과 금 등으로 꾸민 용 머리를 달거나, 손잡이까지 용 형상으로 만든 평평한 작은 국자)를 쓴다. 올리는데 옥두(옥으로 장식한 음식 담는 제사 그릇)와 조찬(과일 등을 담는 손잡이 달린 대나무 광주리)을 쓴다. 마시는데 옥잔을 쓴다. 그래서 새기는데, 벽산과 벽각(술잔 입구를 얇게 고리 모양으로 장식한 옥술잔. 네 되를 담는 크기를 벽산, 다섯 되를 담는 크기를 벽각)으로 한다. 도마로 완(우나라 제사용 도마)과 궐(하나라 제사용 도마)을 쓴다. (단 위에) 올라 가서 청묘(문왕을 찬양하는 시)를 노래하고, 내려 와서 상무(무왕이 상나라 주왕을 치고 나서 지었다는 곡)를 분다. 붉은 방패와 옥으로 장식한 도끼를 들고서 면류관을 쓰고서 대무(주공이 무왕을 도와서 은나라 주왕을 치던 장면을 묘사한 춤)를 춘다. 피변(흰 사슴가죽으로 만든 관모)에 소적(큰 제사 때 피변에 맞춰서 입는, 주름을 넣어 허리에 묶게 만든 짧은 앞치마)을 두르고, 웃통을 벗고서 대하(하우씨가 지었다는 춤)를 춘다. 매는 동이의 음악이다. 임은 남만의 음악이다. 동이와 남만의 음악을 태묘에 바침은 노나라를 천하에서 빛나도록 한다는 말이다.
- 명당위(明堂位), 예기(禮記)
及至周室 設兩觀乘大路, 朱干玉戚 八佾陳於庭, 而頌聲興.
주 왕실에 이르러 두 관(남쪽 궁문 앞 양쪽에 올린 망루)과 승대로(말 네필이 끄는 바퀴가 아홉 달린 수레들이 동시에 다닐 수 있는 남북로)를 건설하고, 붉은 방패와 옥 장식 도끼를 들고 태묘 뜰에서 여덟 줄(팔승무, 천자만이 행할 수 있는 8명씩 8줄로 64명이 추는 춤)로 늘어서니, 공덕을 기리는 소리가 흥하였습니다.
- 동중서전(董仲舒傳), 한서(漢書)
春秋繁露曰 劍之在左靑龍象也. 刀之在右白虎象也.
춘추번로에 이르기를 "검은 좌청룡 형상으로 존재하고, 도는 우백호 형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였다.
烈士傳曰 干將[劍工也] 爲晉君作劍 劍有雌雄. 此可引爲雙刀. 劍之使用云爾.
열사전에 이르기를 "간장[검을 만드는 공인이다]은 진군을 위해서 검을 만들었는데, 검에 암컷과 수컷이 있었다"라고 하였다. 이를 가히 인용하면 쌍도다. 검의 사용을 운운하자면 이러하다.
武編曰 雙刀
他若使一, 伏虎[使刀勢名也. 譬喩爲目下皆倣此] 打我頭脚以左手監住右手一抹[摩也. 斫也.]刀.
若被他徹棒走了翻身一抹刀.
他若使一, 水平槍來扎[拔也]我脚以右手一監住 左手一抹刀.
他若使一, 禿龜來斫我脚面以左手監住右手斫虎口[拇指食指之間].
他若使一, 單提來打我胸[脅也]不拘左右以監住一抹刀.
他若使 老僧拖杖掃我脚以左手監住右手一抹刀.
若徹棒走了就削虎口.
他若使一, 橫龍槍來扎我以左手監住右手一抹刀.
他若使一, 仙人敎化來戳[音逴, 斫也]我以左手監住右手一抹刀.
他若使一, 老鸛銜食来斫我脚以刀十字架住一刀就斫虎口.
他若使一, 鞭鋪來打我以右手監住左手一抹刀.
他若使一, 擧手朝天來打我以刀左手監住右手一抹刀.
他若使一, 虎歇勢來打我拘左右一手監住一抹刀.
用者有法.
무편에 이르기를 "쌍도란
타인이 만약에 하나, 복호(伏虎)[사용하는 도세의 명칭이다. 지금은 다 이를 모방한다.]로 나의 머리와 다리를 치려고 한다면, 칼로써 왼손으로 살펴서 막고 오른손으로 한 번에 없애(抹)[소멸하다이다. 베다이다.] 버린다.
만약 등진 타인이 몽둥이(棒)로 부수려고 한다면 몸을 뒤집어 칼로써 한 번에 없애 버린다.
타인이 만약에 하나, 수평창(水平槍)으로 와서 내 다리를 뽑으려고 한다면, 칼로써 오른손으로 살펴서 막고, 왼손으로 한 번에 없애 버린다.
타인이 만약에 하나, 독구(禿龜)로 와서 내 발가락을 베려고 한다면 왼손으로 살펴서 막고, 오른손으로 손아귀(虎口)[엄지 손가락과 집게 손가락의 사이이다.]를 베어 버린다.
타인이 만약에 하나, 단제(單提)로 와서 내 가슴[겨드랑이다.]을 치려고 한다면, 칼로써 좌우 불구하고 살펴서 막고, 한 번에 없애 버린다.
타인이 만약에 노승타장(老僧拖杖)으로 와서 내 다리를 쓸려고 한다면, 칼로써 왼손으로 살펴서 막고, 오른손으로 한 번에 없애 버린다.
만약 몸둥이(棒)로 부수려고 달려오면 나아가 손아귀를 빼앗는다.
타인이 만약에 하나, 황룡창(橫龍槍)으로 와서 나를 치려고 한다면, 칼로써 왼손으로 살펴서 막고, 오른손으로 한 번에 없애 버린다.
타인이 만약에 하나, 선인교화(仙人敎化)로 와서 나를 찌르려고(戳착)[음은 탁(逴)이다. 베다이다.] 한다면, 칼로써 왼손으로 살펴서 막고, 오른손으로 한 번에 없애 버린다.
타인이 만약에 하나, 노관함식(老鸛銜食)으로 와서 내 다리를 베려고 한다면, 칼로써 십자가로 막고, 한 칼에 나아가 손아귀를 베어 버린다.
타인이 만약에 하나, 편포(鞭鋪)로 와서 나를 치려고 한다면, 칼로써 오른손으로 살펴서 막고, 왼손으로 한 번에 없애 버린다.
타인이 만약에 하나, 거수조천(擧手朝天)으로 와서 칼로써 나를 치려고 한다면, 칼로써 왼손으로 살펴서 막고, 오른손으로 한 번에 없애 버린다.
타인이 만약에 하나, 호혈세(虎歇勢)로 와서 나를 치려고 한다면, 칼로써 좌우 불구하고 한 손으로 살펴서 막고, 한 손으로 한 번에 없애 버린다"라고 하였다.
쓰는 자에게는 방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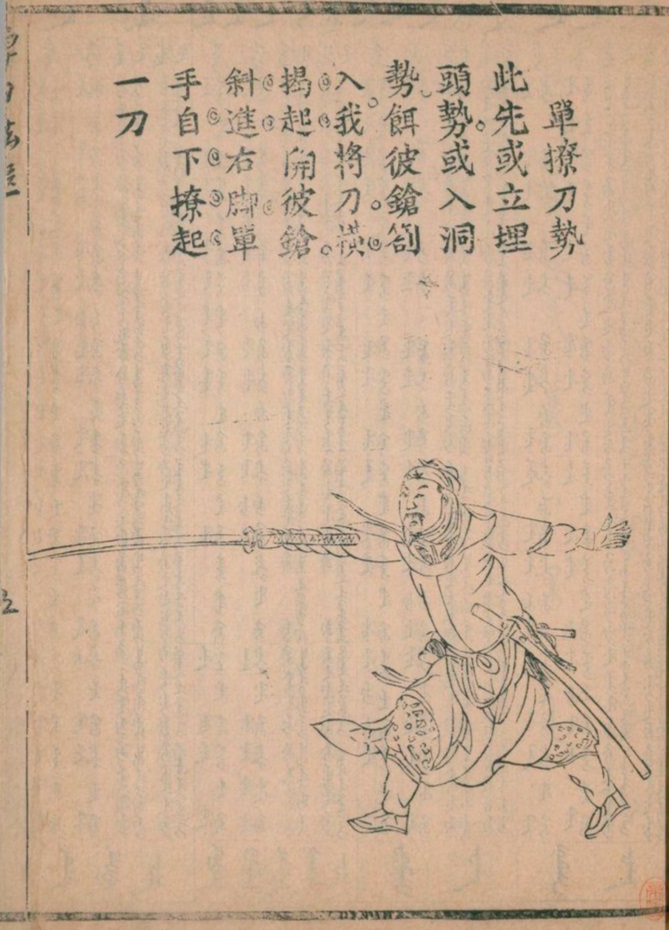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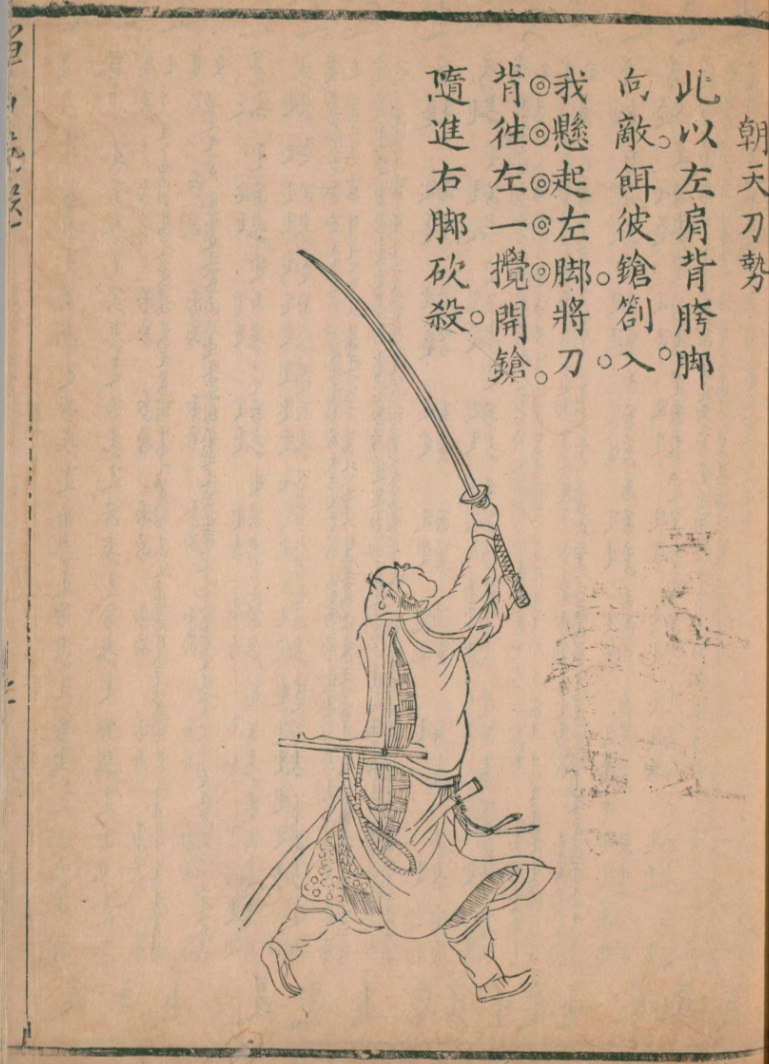
'무예도보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무예도보통지 - 쌍검 3 (0) | 2023.07.16 |
|---|---|
| 무예도보통지 - 쌍검 2 (0) | 2023.07.16 |
| 무예도보통지 - 쌍수도 3 (0) | 2023.07.16 |
| 무예도보통지 - 쌍수도 2 (0) | 2023.07.16 |
| 무예도보통지 - 쌍수도 1 (0) | 2023.07.16 |